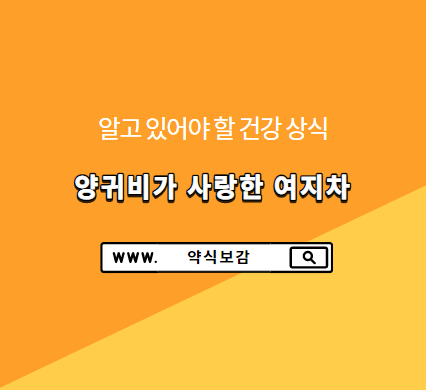
여지차와 정조
중국 사람들은 생활필수품으로 '땔감, 쌀, 기름, 소금, 간장, 식초, 차' 이렇게 일곱 가지를 꼽을 만큼 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차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때는 주로 엽차를 말한다. 하얀 자기에 담긴 엽차는 이루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갈하다.
엽차라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붉은빛이 도는 차가 있는가 하면, 아주 짙은 녹색 차도 있고, 잎이 도르르 말린 것이 있는가 하면, 활짝 펴진 것도 있다. 이 가운데 붉은빛이 돌면서 잎이 말린 차를 상품으로 치고, 그렇지 않은 것을 하품으로 친다.
예전에는 여성에게 절대 두 가지 차를 섞어 마셔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어서, 생산된 지역도 같고, 종류도 같은 것을 마셔야 했다. 심지어 찻잎의 생김새나 색깔도 바꾸지 않고 한결같이 한 가지 차만을 마셔 왔다.
이러한 금기는 당시의 윤리적 가치관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죽는다는 차나무의 절개를 본받아 여성도 한결같이 정조를 지키라는 뜻을 담은 금기였다. 여성이 두 가지 차를 마시는 것은 두 지아비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겼기 때문에 두 가지 차를 마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차를 여성의 절개와 연결시킨 풍습은 고려시대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혼인을 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차 종자를 담은 항아리를 보내는 '봉다'라는 풍습이 있었다. 이때도 차 종자가 번식과 변함없는 절개를 의미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양귀비를 사로잡은 여지차
봄이 들뜸과 흥분, 그리고 충동의 계절이라면, 여름은 격정을 일으키는 추진의 계절이고, 겨울이 회고와 차분함, 성찰과 침정의 계절, 끝으로 가을은 사색과 억제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다.
더위에 시달리며 한여름을 보내고 나면 인체에는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 영양분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은 채 땀까지 흘렸다면 몸이 많이 쇠약해진다. 게다가 가을로 접어들 때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 변화한 기후에 적응할 준비를 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다.
기후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다. 가을은 여름과 달리 습기가 걷히고 공기가 건조해야 한다. 만일 정상 기후에서 벗어나 햇볕이 지나치게 뜨거우면 땀이 줄줄 흐르고, 열이 떨어지지 않으며, 인후통과 갈증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반대로 기온이 지나치게 낮아 싸늘함이 가시지 않으면 두통, 오한, 기침 등이 찾아오기 쉽다.
어쨌든 가을은 메마른 계절이어서 호흡기나 피부도 촉촉함을 잃고 건조해진다. 그래서 화장을 해도 잘 받지 않고, 머리카락이 잘 빠지며 비듬이 많아지는데, 이럴 때 여지를 이용하면 좋다.
여지는 박과에 들어가는 한해살이 덩굴풀로, 양귀비가 좋아하던 과일로도 유명하다. 현종은 사랑하는 양귀비를 기쁘게 해 주려고 수만 리나 떨어진 남쪽 지방에서 나는 진귀한 여지를 구해다 양귀비에게 선사했다. 상하기 쉬운 여지를 싱싱하게 선물하기 위해 빠른 말과 능숙한 기수를 뽑았으며, 대궐에 도착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생각으로 곳곳에 이들을 배치하여 릴레이 식으로 운반하도록 명령했다. 지친 말이 쓰러지고 기수들이 벼랑에서 굴러 떨어져도 여지는 끊임없이 운송되었다. 양귀비가 여지를 좋아한 만큼 현종의 애정도 컸던 것이다.
거죽이 우툴두툴한 여지의 푸른 열매는 익으면서 황적색으로 바뀌는데, 중국에서는 그 생김새가 마치 남성의 음낭처럼 생겼다고 해서 토산불알(생식기에 이상이 생겨 한쪽 음낭이 커진 병증)에 약으로 쓰기도 했다.
<본초강목>을 보면 여지가 자양강장제로서 폐기능을 보강하고 소화기능을 원활히 하며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액을 보충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온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 피부를 곱게 가꾸어 주는 효과가 뛰어나다.
열매의 껍질을 까서 먹거나 구하기가 어렵다면 시중에 파는 통조림도 좋다. 여지는 가을철 메마르고 건조해진 피부에 싱싱한 윤기를 돌게 할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