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제의 대명사 녹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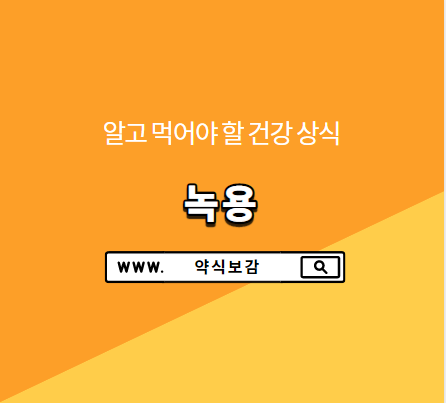
삼용은 인삼과 녹용의 뜻이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강장제를 대표하는 표현도 된다. 건재 약방 간판에 인삼과 녹용이 그려져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인삼의 성분이나 약리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연구가 많이 진척되어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녹용에 대해서는 과학적 자료가 없다.
세종대왕의 세종지리지에 수록된 약재 생산지를 보면 녹용이 함경도, 평안도를 비롯하여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여러 곳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전라도는 산지가 많아 부안, 나주, 해진, 영광, 무장, 함평, 남평, 무안, 임실, 광양, 장흥, 낙안, 순천, 고흥, 동복, 제주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녹용은 녹각과 달라서 미처 각질화되지 않아 유연한 것이며 솜털이 돋은 가자 또는 버섯 모양이기도 하여 대각이라고도 한다. 또한 돋아나는 새순 같다고 하여 용자에는 초두가 붙어 있다. 대개 여름 하지 때에 묵은 녹각이 탈락되고 그 자리에 새로 돋아나오는 것을 적당한 시기에 잘라내어 그늘에서 말린 것이다.
녹용 썬 것을 보면 맨 첨단 부위는 마치 양초처럼 희고 연한데 이것을 엽편이라고 하여 제일 귀하게 치고, 그다음 부분은 혈맥이 통해 있어 혈편이고, 또 다음 층은 벌집처럼 구멍이 뚫려 있고 빛도 검은 자주색인데 풍편이라 하며, 직접 잘라낸 밑부분은 골편이라고 하여 제일 좋지 않은 부분이다.
허약하고 마르고, 사지.허리 등이 쑤시는 것을 고치며, 남자의 정력이 약하고 다리. 무릎에 힘이 없고 밤에는 몽정을 하며 여자는 하혈과 적백 대하증이 있는 것을 보하며 뱃속의 태아를 편안하게 한다. -동의보감
동의보감의 녹용 약효 기재를 읽어보면, 경신, 연년, 불로, 명목, 흑발 등을 내세우고 있는 일반적 보약에 비하여 다분히 강정과 성적 허약 보강의 뜻이 강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인지 [신농본초경]에서도 상품 약이 아니고 중품 약 범주에 넣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댓글